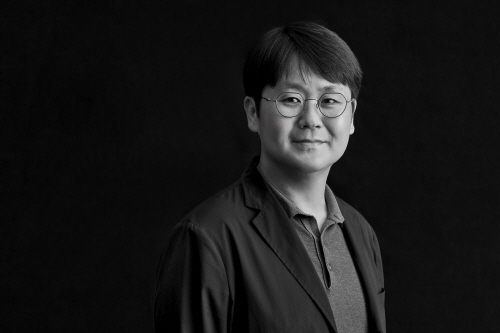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타고 흐르는 곡선, 군더더기 없는 표면의 질감 등 한정용 백자는 색채와 형태, 선의 조화가 어우러져 격조 있는 작품으로 완성됐다.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청담동의 갤러리 완물에서 한정용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2층과 4층 공간에 나뉘어 전시된 작가의 작품은 가장 최근부터 지난 전시의 작품까지 소개가 됐다.
과거를 품은 백자의 재해석
흰색의 백자와 함께 흑색, 붉은색, 푸른색의 백자가 시선을 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이 다른 색감들을 지니고 있으며 닮은 듯하지만,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곡선의 매끈한 외형에서는 긴장감이 아닌 편안함과 순수함이 느껴진다. 애초부터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것이 없고, 미화되어 뽐내지도 않는다. 선을 통한 이상적인 미감으로 관객들은 작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여덟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분할된 표면의 면은 억지스럽지 않다. 치밀함 대신 자연스러운 맛이 담겨 있다. 덕분에 우아함과 함께 안정적인 균형감마저 느껴진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 디테일이 숨어 있다. 수반 형태의 기물 바닥을 들추자 밤하늘의 별이 보인다. 우주를 보는 듯 오묘하고 신비롭다. 작품에 새겨진 도침의 흔적도 독특하다. 먼 과거 그릇을 쌓아 굽기 위해 사용한 시간의 흔적이 재현된 모습이다.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서자 한가운데 주병을 비롯한 찻잔이 보인다. 한편에는 작가의 지난 작업들을 되새기는 작품도 있다. 특히 첫 번째 전시에서 보여 주었던 두 점의 작품 「팔각화기」가 눈에 띈다. 과거를 재해석한 현재, 전시를 통해 백자의 진화를 보여주려한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한정용 백자》전은 조선백자가 가진 예술로서의 가치를 작가만의 재해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통적 미와 정체성은 이어 나가고 면과 선에 대한 미적인 조형성을 더한 그만의 백자라 할 수 있다.

자연을 입힌 가장 자연스러움
백자는 말 그대로 백색의 도자기다. 흰 눈처럼 맑고 청명하며,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매력이 특징이다. 한정용 작가는 한동안 이런 느낌의 백자를 선보여 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백자에 특별한 색감을 입히기 시작했다. 온통 흑색으로 뒤덮인 백자부터, 붉은색, 푸른색까지 백자 위에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혀내기 시작했다. “저는 백자를 만드는 작가입니다. 백자는 흰색이죠. 그 흰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검은색이 존재하게 됩니다. 빛이 존재하는 한 당연합니다. 즉 저는 백자를 만들지만,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어둠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은색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조금 더 다양화해 지금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흑색이라 해도 그 영역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한정용 작가는 원하는 색감을 내기 위해 많은 실험을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흑색만 해도 200여 가지나 된다. 같은 흑색 계열이기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은근함으로 다양한 감성을 만들어 낸다. 이는 붉은색이나 푸른색도 마찬가지. 작품은 반복과 차이를 통해 질감이 달라지고, 빛과 어둠 속에서 보이는 각각의 느낌도 달라진다.
작품에서 보여지는 유려한 선, 이 또한 한정용 백자의 특징이다. 시작과 끝이 투박하지 않고 매끈한 선으로 완성되는데 이 형태가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작가는 평소 주변의 사물, 그 중에서도 자연물에 집중한다. 주로 자연 속 오브제가 작업의 소재가 된다. 시냇가의 조약돌이나 둥지 안의 알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자연물, 이런 아름다운 선들이 일련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면 분할 기법으로 외관이 표현되는데, 작가는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 아닌 표면을 깎는 방법을 사용한다. 각각의 면들은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 익숙해진 손의 느낌에 따라 흘러가듯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복되는 각각의 면들은 마치 음악가의 연주처럼 숙련자의 손을 통해 완성된다.
사진. 편집부, 작가 제공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024년 9월호를 참조 바랍니다. 정기구독하시면 지난호 보기에서 PDF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