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7. ~3. 30.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
젊은 도예가들의 3색 분청 변주곡
2024년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는 윤준호, 전희은, 이정빈 3명의 젊은 작가들이 입주해 작업했다. 윤준호 작가는 올해 레지던시 입주 5년 차로 4년간 레지던시에서 계획하고 실험, 모색해 온 것들을 정리, 완성하는 동시에 올해는 특별히 귀얄과 분청에 집중해 작업과 전시활동을 펼쳤다. 반면 전희은, 이정빈 작가는 올해 초 입주했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작업의 밀도나 방향을 심화하고 창작관의 운영 목표와 지역의 성격을 고려해 고흥 운대리 분청을 연구하며 기존 작업과 분청과의 유사점, 수용 가능성을 연구했다. 3명의 나이, 관심사, 창작지향이 다른 작가들이 작업실과 정주 공간을 공유하며 1년간 부단히 작업한 결과물이 2024년 입주작가 성과 보고전 《분청변주》다.

전시 전경
분청은 14세기 후반에 한반도에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영남을 주요 제작지로 후기 고려청자와 재료와 기법의 유사성을 보였다. 15세기 후반이 되면서 점차 호남지역으로 제작지를 이동하며 조각칼 대신 붓을 이용한 귀얄 혹은 덤벙으로 수법이 변화하였다. 32기의 가마터가 발굴된 고흥 운대리는 해무리굽 청자와 분청사기 등이 함께 출토된 지역이다. 운대리 분청은 조선 15세기 무렵 형성된 서남 해안 지방의 분청 도요지와 마찬가지로 귀얄, 덤벙 등이 주를 이룬다.
귀얄과 덤벙은 상감과 인화에 비해 격식과 엄격함이 덜하다. 작가가 현대 도예의 차원으로 새롭게 시도할 때 재료의 제약이 덜하고 응용의 여지가 넓으며 표현의 허용이 넓다.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을 추종하는 많은 작가들은 상감, 인화보다는 귀얄, 덤벙, 철화 등을 선호한다. 옛 귀얄 분청사기는 무심한 듯 거친 붓질 자국이 매력이다. 서예가의 능숙한 붓질처럼 귀얄을 쥔 도공의 손과 팔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기물 위에 다른 리듬, 생동감이 제각각 느껴진다. 귀얄은 작가가 무심으로 물성 거친 붓질을 거침없이 구사할 때 자유분방함, 기운이 느껴진다. 작가의 몸과 분신처럼 움직이는 붓끝과 궤적은 어설피 흉내 내어 될 게 아니다. 단련된 후에 자유로워진 운필에서 나오는 묘리가 화면에서 펼쳐질 때 비로소 보는 이가 기운생동의 심미를 느낄 수 있다. 귀얄과 달리 덤벙은 백토물에 그릇 전체 또는 일부를 담가서 장식 한다. 백토물이 흘러내리다 어느덧 멈춘 정적인 순간에서 찰나刹那의 순간을 목격한다. 두터운 물감을 뒤집어씌운 듯 점도 있는 물성과 뭉근한 깊이에서는 그리다draw라는 인간의 의지가 사라진 우연성과 추상성이 느껴진다. 귀얄과 덤벙 모두 작가가 어떻게 백토물의 농도와 담금의 정도를 조절했는지에 따라 달리 연출 가능하다.

윤준호 作
윤준호는 박지, 귀얄, 덤벙을 표현에 따라 교차 시도했으나 올해는 철화와 귀얄을 중심으로 즉흥적인 필획의 율동감,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작가의 신체 그리고 고유의 맥동과 힘, 순차적 행위가 흙에 고유의 흔적을 만든다. 이것을 고온의 불에 구워 압축했다. 이러한 윤준호의 표현을 사라지는 신체성을 변성하는 물질을 빌어 기록하는 전위적 실험, 서정적 추상미술에서 볼법한 작가의 정신성에 기인한 수행성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전통 분청의 미적 특질인 무작위, 무기교, 자연미 등을 구하고 현대도예로 새롭게 견인하려는 법고창신의 차원에 더 가깝다. 그러나 첫째, 실증적 유물 연구에 근하여 자기 눈으로 선별한 분청의 유일무이한 미적 특징을 재정립하지 않고 둘째, 제대로 자기 본연의 감각과 행위가 자유화, 체득하지 않으면 자칫 백토물 그리고 열 손가락의 할큄과 빠른 붓질을 층층이 쌓는 일은 방종이 되거나, 선과 색이 얼기설기 얽힌 불규칙한 자국들은 그저 흉내 내기에 그치고 만다. 그러니 분청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자유분방함. 즉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움’에 다다르려면, 기회가 될 때마다 전통을 실물로 가까이 살피고 평소 지식과 수법, 안목을 꾸준히 길러야 한다. 그리고 앞선 선배들 것과 비교 하며 자신만의 취향과 장기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표현, 차별점을 찾아야 한다.

전희은 作

이정빈 作
사진.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제공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025년 3월 호를 참조 바랍니다. 정기구독(온라인 정기구독 포함)하시면 지난호 보기에서 PDF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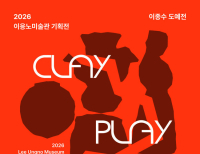
 부산광역시 공예명장_ 이젠 사유의 고통을 지나 자유롭게 펼친 전수걸 항아리의 매력
이탈리아 바지아노 현대미술제 《전수걸 명장 초대전》 2026. 2. 9. ~2. 28. Gallerie d’Italia in basiano, Gallerie d’Italia‘수걸도예’ 공간에서 수많은 항아리가...
부산광역시 공예명장_ 이젠 사유의 고통을 지나 자유롭게 펼친 전수걸 항아리의 매력
이탈리아 바지아노 현대미술제 《전수걸 명장 초대전》 2026. 2. 9. ~2. 28. Gallerie d’Italia in basiano, Gallerie d’Italia‘수걸도예’ 공간에서 수많은 항아리가...
 지유선_ 삶을 빚는 손, 일상을 수용하는 마음
「 기억놀이-기억의 숲」 가변설치 | 도자, 실 | 2013삶과 작업의 경계에서 태어난 조형 언어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도예가 지유선은 흙이라...
지유선_ 삶을 빚는 손, 일상을 수용하는 마음
「 기억놀이-기억의 숲」 가변설치 | 도자, 실 | 2013삶과 작업의 경계에서 태어난 조형 언어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도예가 지유선은 흙이라...
 최홍선_ 기미의 순간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something)
최홍선 개인전《것》2025. 12. 2. ~12. 20. 갤러리완물 최홍선의 전시《것》은 이십여 년 전, 작가가 유럽 여행 중 숲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에 기인한다. 목...
최홍선_ 기미의 순간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something)
최홍선 개인전《것》2025. 12. 2. ~12. 20. 갤러리완물 최홍선의 전시《것》은 이십여 년 전, 작가가 유럽 여행 중 숲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에 기인한다. 목...
 김대훈_ 흙, 물, 불 그리고 언어유희
김대훈 《No Reason》11. 11. ~11. 29. 오매갤러리드로잉을 위한 화면의 연속김대훈의 작업은 형태보다는 회화와 번조에 방점이 있다. 그의 작업은 물감 대신...
김대훈_ 흙, 물, 불 그리고 언어유희
김대훈 《No Reason》11. 11. ~11. 29. 오매갤러리드로잉을 위한 화면의 연속김대훈의 작업은 형태보다는 회화와 번조에 방점이 있다. 그의 작업은 물감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