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을 쌓아 층층이 패턴을 빚는 연리문連理紋. 김덕호 작가는 이 기법으로 흙의 물성과 자연의 흔적을 도자에 담는다. 물레 위에서 색 점토가 겹겹이 쌓이고, 손끝으로 깎이며 완성되는 그의 작업은 전통과 현대가 얽힌 시간을 드러낸다. 연리문은 단순 장식이 아니라, 흙과 장인의 대화 속에서 피어나는 생생한 기록이다.
청화백자에서 피어난 연리문의 씨앗
김덕호의 연리문 여정은 학교 시절부터 싹텄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리문이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계기는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청화백자 전시였다. “청화백자에 대한 전시를 보면서 획의 끝부분에 힘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대신 무의식에 담긴 힘의 느낌을 백자로 옮기고 싶었죠.” 그는 연리문을 단순화하거나 복잡하게 변주하며 자신만의 길을 열었다. “장인이 무심코 내뱉은 흔적이 바깥으로 나타나길 바랐어요. 연리문은 무엇을 그리는 행위이기도 하고, 형태를 이루는 기법이기도 해요.”
그는 청화백자에서 모티프를 얻은 청색토과 백토로 연리문을 시작했다. “청화백자에 그려진 그림의 획 끝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담긴 무의의 힘을 백자로 옮기고 싶었어요.” “수묵의 독백 전시를 개기로 흑색과 백색의 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 개인전 ‘공간’을 기획하면서 한 기물이 아닌 공간 안에서의 색의 대비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작업은 흙을 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서로 다른 색의 점토가 층을 이루며 물레 위에서 회전하고,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물레를 차면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형태가 생겨요. 처음엔 흙을 겹치는 방식에 제 의도가 많이 들어가죠. 물레를 돌리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변화가 한정적으로 일어나게 프로세스를 정합니다.” 이 과정은 흙과 장인의 시간이 얽히며 자연의 리듬을 담아내는 첫걸음이다. “흙은 오랜 시간과 지각변동, 풍화를 거쳐 만들어진 거라, 연리문으로 층을 쌓으면 흙이 지나온 시간이 보이는 것 같아요.”

「흔적Vestige」 14×14×21cm
면치기, 숨겨진 층을 깨우다
면치기는 김덕호 작업의 중심이다.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진 기는 층층이 겹쳐진 흙의 레이어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두가지 이상의 흙을 연리하게되면 보이지 않던 레이어가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죠.”
“면을 치면 레이어 안에 숨겨져 있던 시간과 과정, 구조가 나타나게 되요.” 그는 “「흔적」 시리즈에선 면을 깊이 쳐 서로 다른 흙의 겹을 보이게 함으로써 독특한 문양이 보이게 했고, 「흐르다」 시리즈에선 형태가 만들어지는 흙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어요”라며 작업마다 다르게 접근한다. “면을 치는 깊이에 따라 패턴이 달라져요. 형태에 따라 깊게 면을 쳐 강인한 느낌을 나게 하기도 하고 얇게 쳐서 부드러운 느낌을 나게도 해요”라며 흙의 변화를 탐구한다. 연리문은 실험의 여정 속에서 흙의 숨결을 드러낸다. “공예가가 기물을 만들며 쏟은 노력이 보이길 원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죠.” 면치기는 숨겨진 시간을 끌어내고, 자연의 지층 같은 깊이를 더한다.“면을 침으로써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게 작업의 재미예요.”
「흔적Vestige」 37×37×47cm
색토와 백토의 조합
김덕호에게 연리문 작업에서 색토와 백토의 조합은 핵심이다. “수축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 흙의 성분 차이가 너무 나지 않게 신경 써요. 백자토는 성형할 때 기포가 없어야 하는데, 두 가지 흙을 합치면 기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기포가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성형 중이든 소성 중이든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어서 조심해야죠.” 백자를 다루며 흙의 물성을 세심히 살핀다. “백자가 유난히 예민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강원소반」
자연과 현대의 만남
그의 연리문은 자연에서 뿌리를 찾는다. “흙이 지각변동과 풍화를 거쳐 만들어졌듯, 연리문은 흙이 지나온 시간과 제가 쏟은 시간을 보여줘요.” 물레의 회전과 손의 압력은 흙의 물성을 끌어낸다. “의도는 처음 흙을 겹칠 때 많이 들어가요. 물레를 돌리며 순간적인 우연이 생기지만, 한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조절해요.” 그는 자연의 리듬을 도자에 담는다. “흙이 겹치고 쌓이는 게 시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에서 시작한 연리문은 현대 도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전통의 재현은 저의 몫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며 접한 한국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배어나와요.” 그는 청색과 백색, 흑과 백의 대비를 넘어 공간에서의 조형성을 탐구한다. “하나의 기물 안에서 대비를 맞췄다면, 공간 안에서 기물들이 구성되는 방식도 생각했어요.” 연리문은 현대 도예의 도구로, 그의 손에서 새 이야기를 쌓는다.

<본 사이트에는 일부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도예 2025년 3월 호를 참조 바랍니다. 정기구독(온라인 정기구독 포함)하시면 지난호 보기에서 PDF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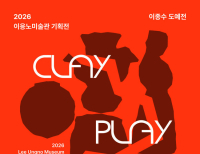
 부산광역시 공예명장_ 이젠 사유의 고통을 지나 자유롭게 펼친 전수걸 항아리의 매력
이탈리아 바지아노 현대미술제 《전수걸 명장 초대전》 2026. 2. 9. ~2. 28. Gallerie d’Italia in basiano, Gallerie d’Italia‘수걸도예’ 공간에서 수많은 항아리가...
부산광역시 공예명장_ 이젠 사유의 고통을 지나 자유롭게 펼친 전수걸 항아리의 매력
이탈리아 바지아노 현대미술제 《전수걸 명장 초대전》 2026. 2. 9. ~2. 28. Gallerie d’Italia in basiano, Gallerie d’Italia‘수걸도예’ 공간에서 수많은 항아리가...
 지유선_ 삶을 빚는 손, 일상을 수용하는 마음
「 기억놀이-기억의 숲」 가변설치 | 도자, 실 | 2013삶과 작업의 경계에서 태어난 조형 언어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도예가 지유선은 흙이라...
지유선_ 삶을 빚는 손, 일상을 수용하는 마음
「 기억놀이-기억의 숲」 가변설치 | 도자, 실 | 2013삶과 작업의 경계에서 태어난 조형 언어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도예가 지유선은 흙이라...
 최홍선_ 기미의 순간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something)
최홍선 개인전《것》2025. 12. 2. ~12. 20. 갤러리완물 최홍선의 전시《것》은 이십여 년 전, 작가가 유럽 여행 중 숲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에 기인한다. 목...
최홍선_ 기미의 순간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something)
최홍선 개인전《것》2025. 12. 2. ~12. 20. 갤러리완물 최홍선의 전시《것》은 이십여 년 전, 작가가 유럽 여행 중 숲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에 기인한다. 목...
 김대훈_ 흙, 물, 불 그리고 언어유희
김대훈 《No Reason》11. 11. ~11. 29. 오매갤러리드로잉을 위한 화면의 연속김대훈의 작업은 형태보다는 회화와 번조에 방점이 있다. 그의 작업은 물감 대신...
김대훈_ 흙, 물, 불 그리고 언어유희
김대훈 《No Reason》11. 11. ~11. 29. 오매갤러리드로잉을 위한 화면의 연속김대훈의 작업은 형태보다는 회화와 번조에 방점이 있다. 그의 작업은 물감 대신...